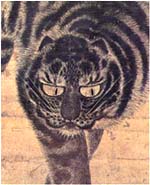[스크랩] 현제 심사정
<심사정의 작품세계 >
맹호도(猛虎圖) 부분도 "새로운 화풍을 이루고 김홍도(金弘道)와 함께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화가"
심사정(沈師正1707~1769) 그는 어려서부터 드로잉에 특출한 능력을 보였고, 그의 나이 20세에 그림 공부를 시작하였다.
![]()
심사정의 자는 이숙 호는 현재(玄齋)이며, 겸재(謙齋) 정선(鄭敾)과 더불어 18세기의 대표적인 문인화가이다. 부사(府使)를 지낸 그의 아버지 심정주(沈廷胄)도 그림을 잘 하였다. 그는 젊어서 정선에게서 그림을 배웠으나, 때마침 유행하기 시작한 남종(南宗)산수화에 심취하여 스승인 정선의 진경(眞景)산수화보다는 전통적 중국 화제(畵題)의 문인화를 즐겨 그렸다. 그의 작품은 산수(山水), 인물(人物), 화훼(花卉), 초충(草蟲) 등 지금 많이 남아 있으며 이 작품들은 각기 여러 기법과 다양한 양식을 보인다. 그러나 많은 작품중 기년작(記年作)은 불과 몇 점에 불과하여 현재 그림 양식의 변천 과정을 더듬기는 매우 힘들다.
심사정의 작품으로는 <방심석전 산수도>, <파교심매도>, <강상야박도>, <하마선인도>, <초충도> 등이 있으며 그의 나이 61세에 그린 <경구화첩> 등이 있다.
심사정은 회화의 다양한 부문을 섭렵하였는데, 동물과 새, 꽃, 곤충, 식물, 그리고 구름과 용을 잘 그렸으며, 특히 풍경화에서 뛰어났다.
그는 정선화법은 물론 중국 명조(明朝)때 이름을 날린 오파(吳派, 沈周)와 원말 사대가(元末四大家)의 화법도 연구하였으며, 특히 황공망(黃公望)의 화법은 그의 초기 풍경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의 나이 50대에 그는 진경산수(眞景 山水)와 중국 의 민왕조 때의 한국화된 중국학파에 근간을 둔 자신만 의 고유한 풍경화 양식을 정립하였다. 심 사정의 풍경화는 정선의 화법과 함께 조선후기의 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明鏡臺(1750)
방심석전山水圖(1758)
破橋尋梅圖(1766)
경구팔경첩
夏景山水圖
여름 장마철 산간의 비오는 경치를 묘사하였는데, 화면의 중앙에 흐르는 시냇물 위에 돌다리가
가로놓여 있고, 오른쪽 근경에 담묵의 버들과 초묵(焦墨)으로 둥지와 가지를 치고 총총히 잎새
를 묘사한 몇 그루 나무가 서 있는데 우장을 쓴 두 행인이 보인다.돌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가면
가파른 벼랑이 있고, 물을 따라 길이 나 있는데, 중경 숲 속에 초가몇 채가 지붕만 보일 뿐이다.
그 뒤로 산등성이가 여름 안개 위로 전개되고, 멀리 담청색의 원산이 보인다. 그 위 왼편 공간에
'천고절작(千古絶作)'이라 끝을 맺는 평시(評詩) 한 구절이 초서체로 써 있어 전체 분위기와 잘
어울리고 있다.
船遊圖
오른쪽에 보이는 '갑신신추사(甲申新秋寫)' 라는 간기의 갑신(甲申)은 1764년에 해당하므로 그의
57세 때 그림으로 비교적 만년작임을 알 수 있다. 바다에는 폭풍이 이는 듯 험한 파도가 소용돌이
치고 하늘에는 세찬 반향(反響)하듯 굽이치는 먹구름이 덮여 잇는데 이 작은 배는 이상할 만큼 평
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 왼쪽 위에는 두 선비가 조금의 동요도 나타내지 않은 채 파도를 감상하며
뱃전에 기대어 있고 그 반대편 끝에서 노 젓는 사공이 대단히 힘에 겨운 듯 몸을 기울려 힘쓰고 있
다. 실로 운치 넘치는 문인(文人)풍류(風流)의 선유(船遊)를 호담한 필치로 그렸다.
雪景山水圖
이 그림의 선비도 필경 이른 봄 눈 속에 핀 매화를 찾아 나선 낭만적인 인물이리라. 부드러운
곡선과 파마준으로 묘사된 언덕과 중경의 산봉우리, 한림(寒林), 원경의 눈덮인 산봉우리 등은
패교심매도(覇橋尋梅圖)와 공통되는 양식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