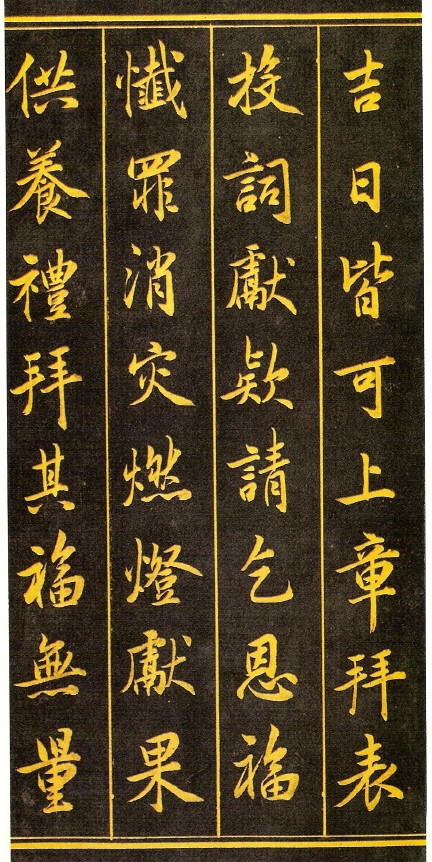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은 새로운 중국을 통치하기 위해 한족 지식인이 필요했다. 그는 32인의 학자를 초빙하였는데, 원나라 유학자 허형이 그 중 하나였다. 그는 부름에 응하여 북경으로 가던 중 그의 친구 유인에게 들렸다. 유인은 “한번 초빙을 받고 바로 이러한 것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고 묻자, 허형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가 행해지지 않습니다”고 했다. 후에 유인 역시 쿠빌라이 칸의 초빙을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고 답변하였다. 허형과 유인 두 철학자 모두 ‘도’를 거론하였지만, 한 사람은 쓰임에 역점을 두었고 다른 한 사람은 존엄성에 무게를 두었다. ‘도’의 의미를 천착할 필요없이 오늘날 말로 쉽게 표현하면, 허형은 이민족 통치를 받아들여 이에 합류하였고 유인은 이를 거절하고 저항한 것이다. 허형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 와서 일단 역사적 평가를 보류하고 당시 현실에서 볼 때 어떤 실천이 그 자신들에게 편하였을까 반문하곤 한다. 문화적 자긍심과 명분을 내세우는 한족 사대부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이민족에 대한 저항으로서 자연에 은거하면서 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 당시 많은 사대부는 이에 따랐다. 그렇다면 허형은 왜 자신에 대한 모멸감을 무릅쓰고 이민족 조정의 관리가 되려고 결심하였을까. 그의 현실적 태도는 무엇일까. 자신의 선택과 역사적 평가는 왜 다르며, 이 두 요인을 어떻게 균형있게 수용하여 평가해야 할까. 이러한 물음을 떠올릴 때마다 첨예하게 대립되어 나타나는 영역이 예술인데, 중국에서는 예술과 정치, 예술과 도덕에 관해 일관되게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이 원나라 화가 조맹부의 예술세계이다.
조맹부 역시 허형처럼 원나라 조정의 관리가 되었다. 다만 조맹부는 송나라 태조의 세 번째 아들인 진왕(秦王) 덕방(德芳)의 후예로 모든 사대부들의 사표가 되어야 할 존재였지만, 쿠빌라이 칸의 부름에 응하여 한림원학사승지(翰林院學士承旨)까지 올랐다는 것이 다르다.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송나라 유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유민화가 정사초는 조맹부와 절교를 하여 여러 번 방문하여도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 차라리 많은 유민의 뜻에 부응하여 지조를 지키며 자연에 은거하였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것을, 조맹부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었을까.
 |
조맹부(趙孟頫), <작화추색도(鵲華秋色圖)>, 종이에 채색, 원(1295년), 28.4×93.2㎠,
대북 고궁박물원. |
조맹부는 산수, 고목수석, 대나무, 말 등을 잘 그렸다. 특히 <작화추색도>와 같은 산수화는 복고와 창신을 통해 중국회화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켰던 그림이다. 그러나 그의 출사와 관련되어 스스로 항변하고 후대에 비판받아 왔던 것은 말 그림을 통해서가 아닐까 한다. <인기도> <욕마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말 그림에는 두 가지 특색이 있다. 하나는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하나는 말이 살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후 미술비평가에게 그의 출사와 관련되어 비판받아 왔는데, 당나라 한간의 <조야백>과 원대 유민화가 공개의 <수마도>와 비교하여 감상하면 그 의미가 잘 통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말에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중국 사대부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주나라 백락(伯樂)이 천리마를 분별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임금이 사대부 능력을 인정하여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비유된다. 백락이 천리마를 만나고 임금이 명신을 만나는 것은 사실상 ‘천재일우’에 해당하지만, 임금이나 사대부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개원의 치’라고 불리는 당나라 현종 시대에 천자 마구간에 있는 명마를 그린 <조야백>은 이러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천리마의 골격이 풍만한 살집 안에 감춰져 있고 그 기상이 밖으로 표출되었다.
 |
전 한간(韓幹), <조야백도(照夜白圖)>, 당, 종이에 채색, 30.8×33.5㎠, 뉴욕 메트로폴
리탄미술관. |
그러나 원나라는 군주가 없는 이민족의 통치 시대이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명군을 잃어버렸다. 당시 사대부들은 이민족 통치를 부정하고 각각 흩어져 은거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을 말에 의탁하여 표현한 것이 원나라 유민화가 공개의 <수마도>이다. 천자 마구간에서 뛰쳐나와 황량한 들판에서 수척한 모습으로 외롭게 서 있는 천리마가 바로 그들 자신의 처지가 아니겠는가. 이에 공개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제발을 적었다.
한결같이 구름을 따라 하늘의 관문에서 내려와,
단지 선조의 천자 마구간 열두 칸을 채웠지.
지금은 누가 준마의 기골을 애달파 하리,
석양이 비친 물가의 그림자 산처럼 고요하구나.
一從雲霧降天關,空盡先朝十二閑,
今日有雖憐駿骨,夕陽沙岸影如山.
청나라 경학자 완원(阮元)은 일반적인 말은 갈비뼈가 10개 남짓인데 이 말은 15개가 그려져 천리마임을 확증하였다. 원나라말기 4대화가 예찬은 이 그림을 보고 원나라 유민화가로서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화사(畵思)와 시정(詩情)이 넘쳐난다고 하였다.
 |
공개(龔開), <수마도(瘦馬圖)>, 두루마리 종이에 수묵, 원, 30×57㎠, 오오사카 시립미
술관. |
말의 또다른 의미는 북방 오랑캐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는 북방 유목민족과의 투쟁을 통해 전개되었는데, 유목민족의 침입을 경계할 때 “변방의 말이 살찔 때 목초가 없어진다”고 노래하곤 하였다.
이 두 의미에서 조맹부의 말 그림은 후대 어떻게 평가되었을까. 조맹부는 “한간의 작품 3권을 얻어 비로소 그 뜻을 얻어서” 그렸던 <인기도>에서 “스스로 당나라 사람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였지만” 명나라 담경봉은 “정교하여, 당나라 화가의 온후하고 옛스러운 맛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정교(精巧)는 고졸(古拙)과 다르게 현실을 따르는 미학적 개념이다. 이는 그가 원나라 왕조에 복직한 현실적 달콤함을 빗댄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조맹부의 말 그림은 송나라를 멸망시켜 공을 세운 변방의 말을 임모한 것이며 그림에 나오는 관리의 고급스런 관복은 조맹부의 입조임을 풍자한 것으로,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말 적려(赤廬)가 곤경에 빠진 주인을 구해낸 것과 같은 정신이 없는가라고 반문하였다. 명나라 서발(徐勃)이 “천자의 마구간 열두 마리의 진실로 뛰어난 종자, 한갓 북풍을 향해 슬피 우네”라고 시를 지은 것은 조맹부의 말 그림과 공개의 <수마도>를 대비시켜 그의 회절을 역설적으로 노래한 것이다.
여기에서 조맹부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행동의 실천이 마음과 다름을 거듭 탄식하면서”, “지나간 일은 이미 어떻게 말할 수 없고, 다만 충직으로 원나라 황실에 보답하련다”고 자책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는 <이양도>를 그려 자신을 변호하였다. 한 마리는 곧바른 자세로 서있고 다른 한 마리는 고개를 쑥이며 풀을 뜯고 있는데, 아주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그렸다. 조맹부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제문을 썼다.
나는 말을 그린 적은 있어도 양을 그린 적은 없었다. 중신이라는 사람이 (양의) 그림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고의로 장난삼아 그렸다. (이 그림은) 비록 옛사람(의 경지)에 꼭 들어맞을 수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기운에 있어서는 성취한 바가 있다.
余嘗畵馬, 未嘗畵羊, 因仲信求畵, 余故戱爲寫生, 雖不能逼近古人, 頗於氣韻有得.
여기에서 말을 그렸다는 것은 지조의 지킴을 말하며, 양을 그린 것은 자기희생을 의미한다. ‘중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외부의 요구에 의해 자신이 시대의 희생이 되었다고 강변하는 것 같다.
원나라를 통치한 몽고족이 어떤 민족인가. 고려에 침입하여 많은 문화재를 파괴하였듯이, 세계문화사에서 문화파괴주의자 반달족에 버금가는 민족이 아닌가. 한족의 뛰어난 문화가 몽고족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맹부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한 몸 희생을 통해 한족의 정신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의 경지)에 꼭 들어맞을 수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기운에 있어서는 성취한 바가 있다”고 자부하면서 작품에서 오로지 “고의(古意)”를 강조하였다. <인기도>의 제발에서 “그림은 어렵지만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이러한 고의(古意)의 추구는 누구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스스로 위안을 삼은 것으로 보인다.
 |
| 조맹부(趙孟頫), <인기도(人騎圖)>, 종이에 채색, 원(1296), 30×52㎠, 북경 고궁박물원. |
그의 <조량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말의 갈기는 곧바로 세워져 있고, 꼬리는 뒤돌려져 있으며, 마부는 소매를 들어 얼굴을 가리고 그 옷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이 네 가지의 움직임은 모두 오른쪽 방향으로 쏠려있다. 그런데 말의 형상은 바로 공개의 <수마도>에 나오는 천리마를 연상시키지 않는가. 황량한 들판에서 삭풍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시키려는 인물의 의지적인 얼굴 표정이 인상적이다. 회화적으로 조맹부 이후 많은 화가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지키고자한 한족의 문화정신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
조맹부(趙孟頫), <조량도(調良圖)>, 화첩 종이에 수묵, 원, 22.7×49㎠, 대북 고궁박
물원. |
나는 조맹부의 예술을 음미해 본다. 그의 내면적인 의지를 생각하자니 그가 결과적으로 원나라의 이민족 통치를 인정하게 된 것을 뿌리칠 수 없다. 그렇다고 그의 도덕적 지조의 회절만으로 평가하자니, 남모르게 노력한 자기희생을 외면하기 어렵다. 어느 정도 이 두 가지 요인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평가하려고 하지만, 단 한 가지가 강하게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권력과 물질적 풍요를 쫓으면서 화폭 앞에서는 ‘기운’이니 ‘고의’이니 ‘인격’이니 ‘도덕’이니 하며 고고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젊은 동양화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